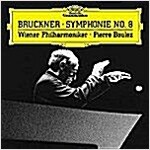

블레즈 지휘 8번과 귄터 반트의 9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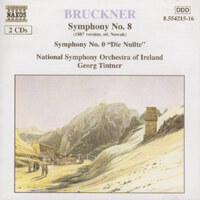 게오르그 틴트너 지휘의 브루크너 2, 3, 4, 7, 8번
게오르그 틴트너 지휘의 브루크너 2, 3, 4, 7, 8번
이번 태풍이 지나가면 가을이 성큼 다가오겠지.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컴퓨터를 켜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무렵에 컴퓨터를 끄면 공식적인 나의 하루가 끝난다. 대체적으로 무력하고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날들이 5, 6, 7, 8월... 9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람 만나는 일도 없었고 집안에서 일을 하다보니 외출복을 입는 일 또한 없었다. 화장품을 사지 않았고, 옷을 산 일도 없다. 한 가지 외모상으로 변한 건 있다. 집 앞에서 2만원짜리 파마를 했다는 것. 그 파마를 하고 나서 머리숱의 반이 빠져버렸다.
사람과의 소통이 없는 대신 내게는 음악이 있다. 지금 하는 일 또한 음악과 관계된 일이니 고맙고 묘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엔 브루크너를 자주 접한다. 틴트너 음반과 블레즈, 귄터 반트는 정말 모처럼 아주 오랜만에 구입한 앨범이다.
구매를 하면서 내게 이런 사치도 없다면 무슨 낙으로 살아야하나, 그 힘으로 밀어부치긴 했지만...
브루크너는 침울하고 어두운 말러와 웅장한 베토벤 사이에서 들으면 들을 수록 익숙해지는 게 아닌 낯선 곡을 처음 대하게 하는 작곡가 같다. 그의 음악을 들으면 심란하면서 뻥 뚤린 느낌을 갖게 된다. 삶의 불안함, 왜곡된 감정, 외로움, 희열의 상태를 어떻게 그리 정확하게 음악이란 그릇에 담아 놓았는지 때로 신기하다. 그래서 나는 간혹 삶에서의 자존감을 이 허공에 이 공간에 어쩔 수 없이 기대는지 모른다.
한밤중에 브루크너 8번을 들을 때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 새벽, 같은 시각에 브루크너를 듣는 사람이 지구 상에서 몇 명이나 될까, 문득 궁금해지기도 했다.
마흔을 앞두고 있는 나이에 살아갈 방향을 못 찾고 음악으로 위안을 받으며 마음을 삭이는,
먼 우주에다 쏘아올린 우리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어떤 생명체가 지구의 음악을 처음 접했을 때의 감정은 어떨까, 마치 그것은 지구가 생성하면서 수많은 변화와 적응을 거쳐 차곡 차곡 쌓아왔던 무수한 시간속 아름다움을 한순간에 아무 예고 없이 맞게 되는 기적을 누릴지도 모른다. 그들은 분명 공허하고 슬픈 암흑 속을 떠돌다 한 줄기의 희망을 만나게 될 것이다.
브루크너를 여기저기 알아보다 귄터 반트의 뤼벡 성당 녹음,
첼리비다케의 리스본 실황이 구하기도 어렵고 꽤 유명한가 보다.
사실 브루크너의 8번이, 3악장과 4악장이 내 귀에 들려온 건 EMI의 뮌헨 필하모닉, 첼리비다케의 아주 느린 연주였다.
그 전엔 칼 슈리히트로 딱 한번 접하긴 했지만 브루크너를 좋게 받아 들이게 한 장본인은 역시 첼리다.
어떤 이는 굉장히 명상적이다 못해, 불교적이고 지루하다고 하지만. 블레즈의 연주와 비교해서 듣고 나니 그 말이 과연 맞는가 싶다.
그래도 나는 그의 연주가 더 좋다. 느리고 심오하고 유장한 3악장이.
나는 언제나 똑같이 책상에 앉아 자료를 찾으며 일을 하고 있고 창문 밖 풍경 담쟁이만 늙어 있다.
물론 나도 그 담쟁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늙어 있다. 흰 머리와 시들은 얼굴로.
삶의 보잘것없음을 유독 제대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나란 사람일지도.

